일본어를 처음 접하면 한국어와의 유사성에 당황하게 된다. 문법뿐만 아니라 발음까지 비슷한 수많은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각국의 고유 발음을 나타내는 훈독에서는 유사성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한자의 음을 나타내는 음독의 경우, 한자문화권 국가 간에 일정 수준의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슷한 발음은 일본이 만들어낸 근대 개념어들이 한자문화권 국가에 큰 위화감 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던 언어적 기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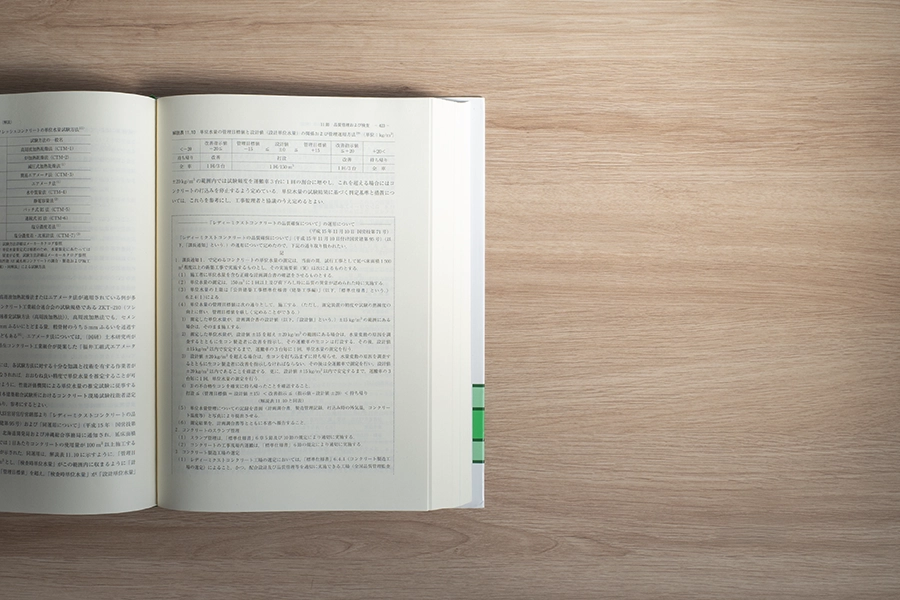
오늘날 우리가 고유 한자어로 착각하며 사용하는 단어 중 대다수는 사실 일본에서 서양의 근대 개념을 번역하며 새롭게 만든 것이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서양과 교류했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서양으로부터 유래한 근대 개념을 한자화했고 그 결과 탄생한 수많은 일본제 한자어는 한국과 중국 등 다른 한자문화권 국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유입된 일본제 한자어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법률, 경제, 학술 분야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그리고 국민 대부분은 그것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다.
일본제 한자어의 사용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의 업적 또한 이유 없이 폄훼하거나 무시할 필요도 없다. 일본이 서양문물을 수용하며 이룬 성과를 같은 한자문화권 국가들이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일본제 한자어를 활용했을 뿐이다.
우리가 매일 듣고 말하는 정치·사회 용어, 공부할 때 자연스럽게 접하는 수많은 학술 용어들, 그 기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언어는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유입되고 변화한다. 무비판적인 수용도 문제지만, 단지 일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